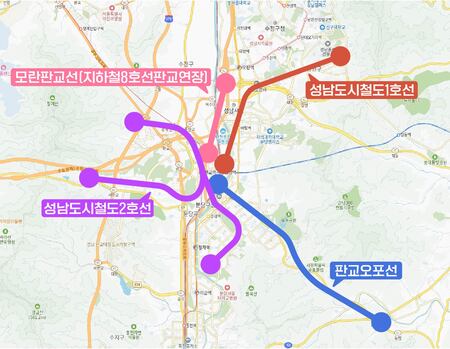[추억을 소환하다] 구두장인, 손님의 발에 편안함을 신기다
상대원1동 리버플 양화점
제화공에게는 ‘선도 안 보고 딸을 보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인기 직업이었다. 신발은 만드는 족족 팔렸고 당연히 양화점에서는 높은 몸값으로 숙련된 제화공을 찾았다.
70년대 초, 당시 양화점은 서울 명동에 모여 있었다. 지금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금강, 에스콰이어, 엘칸토도 이곳에서 양화점이란 이름에서 커나갔다.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에게 양화점이라는 이름은 생소하고 거리에서 양화점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리버플 양화점 조성복(77) 사장은 17살에 구두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명동 미진양화점(현 금강제화)에서 제화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또각또각… 뾰족구두가 인기 있던 시절이었다 견본, 재단, 박음질 등 구두 한 켤레 만드는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하다 보면 완성품은 하루에 3켤레 정도였다. 굽이 높고 뾰족한 하이힐은 인기가 좋았다.
언니의 뾰족구두를 신어 보며 어른을 꿈꾸던 아이들은 교복을 벗고 스무 살이 되면 하이힐을 신었다. ‘나도 이제 어른이다’라는 표시처럼 높은 굽을 선호했다.
“스승께서 신발을 만들어 보라고 해서 처음으로 신발을 만들었을 때,그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는 조성복 사장은 전역 후 70년대에 성남 태평동에 자리를 잡고, 17년 전 지금의 상대원1동으로 이사했다. ‘리버플 양화점’이란 간판이 달린 작은 규모의 양화점을 그대로 인수했다.
구두 만드는 공정이 기계화되다 보니 많은 양, 각양각색 디자인의 신발들이 우후죽순 쏟아지던 때였다. 내 발에 꼭 맞는 맞춤신발보다는 신발의 치수에 내 발을 맞춰 구입하는 시절이었다.
양장, 양복에는 무조건 구두를 신었다 “이제 구두를 맞춰 신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하이힐을 신은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굽 높은 구두를 맞춰 신던 고객들은 굽 낮은 신발을 신는 나이가 됐고, ‘정장에 운동화를 신는다?’, 과거엔 상상도 못 했던 패션을 사람들은 따른다”는 조 사장의 말에서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
손으로 하던 재단을 기계로 하고 대량 생산체제가 갖춰지면서 구두 전체를 만들 수 있는 제화공은 사라져 갔다. 공장에서 제화공도 자신이 맡은 일만 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재단하는 사람은 재단만, 망치질하는 사람은 망치질만 하는 식이다.
사람마다 다른 발 모양과 크기에 상관없이 230, 260, 275 정해진 크기에 따라 신발이 만들어지고, 소비자는 가게 유리창 너머 진열된 구두에 눈길을 주다가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바로 사 들고 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구두를 사기 위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거칠어야 할 것 같은 구두 장인의 손이 곱다 가죽을 틀에 맞춰 기계로 당기는 것과 손으로 당기는 것은 다르다. 수제화는 신발에 창을 대고 가죽을 다듬으며 소비자의 발에 맞게 보정을 한다.
“구두를 만드는 손이라고 보기엔 손이 고와요.” 기자의 말에 허허 웃으며 “그만큼 일이 없다는 거죠”라고 말한다. 조 사장의 말에 씁쓸함이 묻어난다.
신발 한 켤레를 다 만들 수 있는 제화공이지만 일감이 거의 없어 수선을 주로 한다. 그래도 찾아오는 단골이 있으니 계속해서 구두를 만들고 수선할 생각이다. 봄이 왔으니 봄에 어울리는 디자인의 견본 신발을 많이 만들어 놓고 손님을 기다려 볼 계획이다.
취재 윤해인 기자 yoonh1107@naver.com 취재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 이 지면은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성남의 모습을 시민과 함께 추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변에 30년 이상 오래된 이색가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착한가게, 장인 등이 있으면 비전성남 편집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729-2076~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