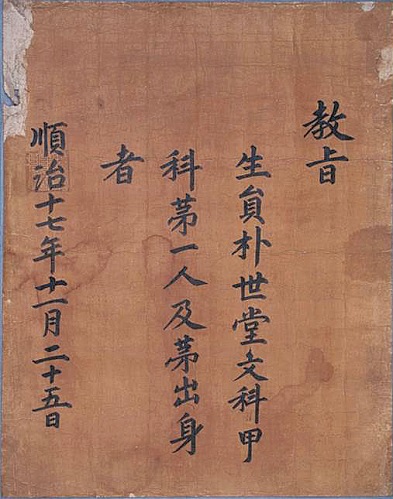요즘 사람들은 입학, 입사, 승진 등 끝없는 시험 속에서 살고 있다. 조선시대 유생들도 관직에올라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과거시험 준비에 고군분투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과거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적지 않게 생겨났으며 그 폐단 또한 심각했다. 고려 광종 때 처음 시행하던 과거제도는 조선에 와서 더욱 발달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시험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거시험을 둘러싼 과열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합격을 향한 욕망은 커져갔지만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진 상황에서 부정한 방법을 꿈꾸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시험장 관리의 문란이 과거 부정을 부추겼다. 원래 유생들은 시험 당일, 출입문 앞에서 옷과 소지품 검사에 임해야 했다. 하지만 응시생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험장 관리는 점차 허술해져서 시험장 안에 간식이나 술, 담배를 파는 장사꾼까지 드나들 정도였다. 1686년 4월에는 숙종이 성균관에 행차해 시험을 주관한다는 소문을 들은 유생들이 몰려와 시험장에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다투다가 여덟 명이나 밟혀 죽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시험장 관리가 잘되지 않다 보니 응시생을 보좌하는 수종(隨從)이 함부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자주 있었다. 또한 커닝 페이퍼를 몰래 끼고 과장을 출입하는 가장 고전적인 부정행위를 쓰기도 했다. 『지봉유설』을 보면 생원·진사 시험에 응시한 자들이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종이에 적어 넣은 후 종이를 콧구멍에 숨겨서 시험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답안지를 작성할 때 남의 글을 베끼거나, 아예 대리시험을 보게 하는 일도 흔했다. 그러다 보니 1566년(명종 21)에는 글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 세 명이나 대리시험으로 생원·진사시에 합격하는 일도 있었다. 시험 답안지를 빨리 내는 것을 뜻하는 ‘조정(早呈)’도 과거시험의 폐단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한다. 응시생이 크게 늘어나자 시험관들이 먼저 제출한 답안지만 채점해서 합격자를 내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자 일부 응시생들은 시험 답안을 미리 써온 후 시험장에서 빈자리만 채워서 재빨리 제출하거나, 혹은 시험지의 앞부분만 제대로 작성하고 뒷부분은 엉터리로 적당히 채워 넣는 협잡을 자행하곤 했다. 부정행위가 발각될 경우 형벌과 함께 과거시험 응시를 제한하거나 합격자 발표가 이미 끝난 후라도 과거 급제를 취소하기도 했다. 또한 시험 전체의 부정행위가 심각해 전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파방(罷榜)이라 해 시험 전체를 무효화시키는 조치가 단행되기도 했다. 파방은 해당 시험 합격자 모두의 합격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부정행위와 전혀 무관한 일부 합격자들로서는 그야말로 그토록 꿈꾸던 과거 급제의 꿈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었다. 숙종 때에는부정행위로 비롯된 대규모의 옥사인 이른바 ‘과옥(科獄)’이 두 차례나 발생했다. 이런 일들은 과거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거시험은 출세의 사다리로써 국가가 인재를 등용하는 핵심 제도였다. 하지만 시험이 갖는 순기능 이면에 감추어진 어두운 그림자 또한 그 시대의 한 모습이었다. 11월 수능을 앞두고 역사를 되짚어보며 효과적이고 공정한 시험 관리 방법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