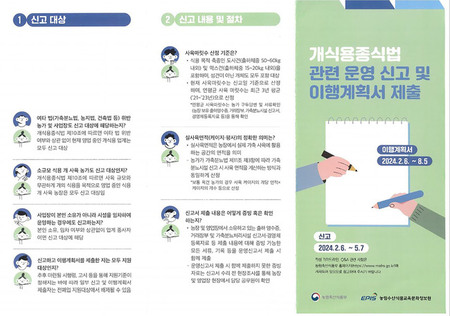옛 선인들은 단오절에 즈음해 부채를 선물했다. 그 부채를 절선(節扇)이라 불렀다. 부채는 통상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둥그런 모양의 단선(團扇)이고 다른 하나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접선(摺扇)이다.
우리나라 접선은 고려시대 이래로 중국인에게 많은사랑을 받으며 외교상의 예물로 활용됐다. 중국 사신이 올 때마다 엄청난 수량의 접선을 요구한 사실이 『조선왕조실록』 도처에 기록돼 있다.
부채는 전통시대에 문학 소재로 종종 활용됐다. 유배지로 내쳐진 선비, 낭군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자신의 처량한 처지를 가을 부채에 빗대곤 했다. 이것은 한 성제(漢成帝)의 후궁 반첩여(班婕妤)가 성제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조비연(趙飛燕)에게 총애를 빼앗기고 나서 자기 신세를 읊조린 <원가행(怨歌行)>이란 시편에서 유래한다.
반첩여는 “님의 품속 드나들며 산들바람 일으켰으나, 서늘한 가을바람에 더위 물러가면, 상자 속에 버려질까봐 늘 두려웠지.”라고 노래했다.
“단오 선물은 부채요, 동지 선물은 책력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부채는 태생 자체가 더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만든 물건이다. 김상헌(金尙憲)이 한여름에 먼길을 나서자 신흠(申欽)은 “무더운 길에서 흙먼지에 찌들까 염려되어, 멀리 떠나는 벗에게 한바탕 맑은 바람을 띄우네.”라 노래한 뒤, 부채를 건넸다. 신흠의 애틋한 우정이 묻어난다.
단오를 전후한 시기에 머잖아 찾아올 폭염에 대비해 소중한 이들에게 ‘절선’을 선물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채제공 초상화를 보면 향낭이 달린 접선이 손에 쥐어져 있다. 채제공이 접선과 향낭을 들고 있는 까닭은 그림 왼편에 적힌 화상찬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네 몸과 네 정신은 부모님의 은혜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임금님 은혜로다 부채도 임금 은혜, 향 또한 임금 은혜 육신 꾸민 것 중에 임금 은혜 아닌 게 없거늘 부끄럽게도 물러난 뒤 은혜에 보답할 길 없네
‘은혜’라는 표현이 매 연마다 등장한다. 정조가 친히 하사한 물건이기에 부채와 향낭을 쥐고 있는 것이다.
부채와 향낭이 임금 은혜의 표식이므로 채제공은 그림 속에도, 문집 속에도 남기고 싶었다. 그렇다면 부채를 주는 것은 그저 납량(納涼)의 의미일 뿐일까?
부채는 크기가 작아서 휴대하기에 편리하다. 따라서 부채질할 때마다 자신을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부채를 전하기도 했다. 오윤겸(吳允謙)은 연행 도중 중국에서 사귄 벗에게 이별의 선물로 부채를 주었다. 부채에는 “어디서 그리워한들 만난 것과 진배없을 게요,한 줄기 맑은 바람이 얼굴에 도달할 때마다.”라고 씌어 있었다. 바로 그리움의 신표다.
이 밖에 어진 정치의 바람을 일으키라는 당부의 뜻도 담겨 있다. 진나라 원굉(袁宏)이 지방관으로 부임할 때 전별의 연회가 열렸다. 벗 사안(謝安)이 부채 하나를 선물로 주자, 원굉은 “의당 어진 바람[仁風]을 일으켜 백성들을 위로하겠소.”라 대답했다. ‘인풍(仁風)’이 부채의 이칭이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최치원(崔致遠)이 지인에게 띄운 글에서 “수레에서 내리자마자 은택이 두루미칠 것이요, 부채를 들면 어진 바람이 널리 불 것입니다.”라 말한 것도 같은 의미다. 전통시대에 출사하는 지인에게 부채를 건네는 것은 익숙한 장면이다. 여기에는 어진 정치에 대한 당부와 염원이 깃들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한 지 1년 반이 돼 간다. 팬데믹이란 용어가 어느새 익숙해졌고 마스크 착용도 일상이 됐다. 수백 명을 상회하는 확진자 숫자에 무덤덤해질 때조차 있다. 올여름에는 폭염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한다. 온통 눈살이 찌푸려지는 뉴스뿐이다.
부채에 담긴 뜻을 상기하며 분위기를 일신해 보는 건 어떨까? 사랑하는 이들에게 멋진 합죽선을 쥐여 주자. 납량과 애정, 그리움의 뜻을 담뿍 담아서. 그리고 공부에, 연구에, 업무에, 육아에 지친 가족, 혹은 지인에게 부채를 선물하자. 이마에 맺힌 땀을 식힐 때마다 ‘신바람’이 절로 나지 않을까.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