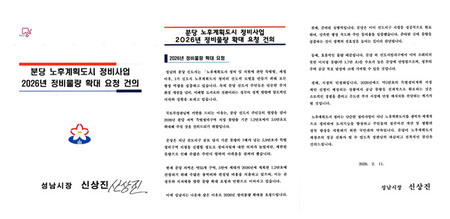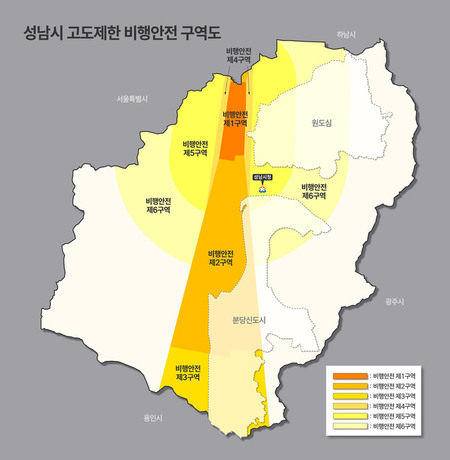인도에 살고 있는 스미타. 딸 랄리타에게 남의 똥을 맨손으로 긁어모으는 다르마(의무)를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등교 첫날 랄리타는 브라만 계급 선생에게 매질을 당한다. 다른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한 학교에서 거부당했다. 스미타는 주어진 운명을 벗어야겠다고 결심한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 시칠리아에 살고 있는 줄리아. 16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가업인 가발 공방에서 일을 돕는다. 아버지의 교통사고와 공방의 파산, 가족들은 속수무책. 엄마는 줄리아에게 돈 많은 동네 청년과 결혼하라고 한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라. 남성우월주의 로펌에서 여성 변호사 최초로 임원으로 승진했다. 사생활을 포기했다. 아이들에 대한 죄의식을 거북이의 등껍질처럼 짊어지고 다닌다. 남자변호사 게리 커스트는 어느 상황에서나 항상 적의를 드러낸다. 최정상이 눈앞인데 암이 제동을 건다. 사라는 이제 로펌의 효율과 수익을 떨어뜨리는 폐품일 뿐이다. 스미타는 여자, 아이,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더 괴롭히는 사회를 증오한다. 사라는 건강한사람들이 병자, 약자, 사회 취약층을 향해 세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다. 이 작품의 원제는 《La Tresse(라 트레스)》다. 프랑스어 ‘tresse’는 “세 갈래로 나눈 머리카락을 서로엇걸어 하나로 땋아 내린 머리”라는 뜻이다. 스미타, 줄리아, 사라는 서로 모르는 채 하나로 엮인다. 이야기의 절정이다. 스미타는 태어난 것을 후회하는 여인의 눈에서 천년을 내려온 슬픔을 느낀다. 사라는 질병과 실직이라는 두 겹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이러한 공감과 연대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다. 우리는 공감과 연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작가 래티샤 콜롱바니는 세 명의 이야기를 여러 장면으로 나눈 다음 스미타, 줄리아, 사라 순으로 돌아가며 보여 준다. “세 갈래 길”은 극적인 장면 전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한다. 독자들은 현실에서 겪었거나 겪었을 법한 주인공들의 처지에 깊이 공감할 것이다. 주인공들은 주어진 삶을 스스로 바꾸고자 한다. 인습과 차별, 억압에 맞서야 한다. 지금보다 더 험난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부당하고 잔인한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다. 주인공들이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을지는 주인공들도 독자들도 모른다. 주인공들도 독자들도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운명이다. 전우선 기자 folojs@hanmail.net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